[데일리스포츠한국 최광웅 기자]
국민의 혈액과 수돗물에서까지 검출되는 유해 화학물질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국의 수질 규제는 여전히 국제 기준보다 크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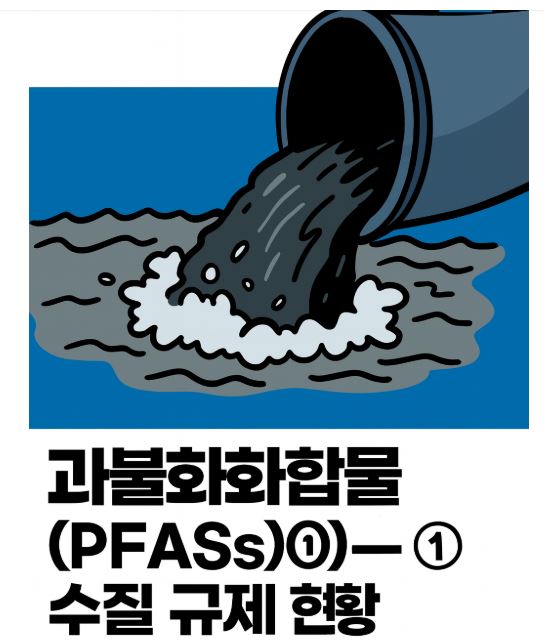
PFAS는 프라이팬 코팅, 방수 의류, 화장품, 포장재, 심지어 반도체 공정까지 현대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영원한 화학물질’이다. 문제는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오래 남으며, 일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될 만큼 위험하다는 점이다.
2021년 환경보건 조사에서 한국인의 혈중 PFAS 농도는 미국인의 3배에 달했다. 실제로 낙동강 인근 방류수와 대구·부산 수돗물에서도 PFAS가 반복적으로 검출됐다. 이미 국민은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각도로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3년 PFOA·PFOS 기준치를 각각 4 ng/L(4ppt)로 대폭 낮췄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PFAS 총합 100 ng/L 이하로 규제한다. 일본과 캐나다도 이미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8년에야 수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기준은 2018년 미국 권고치를 따라 만든 70ppt(현 미국 기준의 17.5배) 수준으로, 최신 과학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그나마도 ‘감시 항목’일 뿐 실제 규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배출 기준·정화 기준·폐기물 관리 기준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공장 폐수, 하수처리장 방류수, 산업 폐기물 등 PFAS의 주요 배출 경로에 대한 규제가 없어 오염 확산을 막을 장치가 없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 4대강 PFAS 농도 연례 공개 ▲ 수질 기준과 배출 기준 동시 마련 ▲ 오염 지역 정화·복원 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긴급 촉구했다.
한편 PFAS는 과학자들이 “한 번 노출되면 몸에서 빠져나가기까지 5년 이상 걸리는 물질”이라고 경고하는 화학물질이다. 국민이 이미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8년까지 기다리자는 정부의 태도는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25 인천국제마라톤] 이모저모](https://cdn.dailysportshankook.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418992_427689_410_1763967850_250.jpg)

![[포토뉴스]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브리핑하는 김영록 전남지사](https://cdn.dailysportshankook.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418699_427213_4557_1763595958_250.jpg)

![[포토뉴스]광주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증진대회 열어](https://cdn.dailysportshankook.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418292_426587_1112_1763100672_250.jpg)

![[포토뉴스]강기정 광주광역시장, 2025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 함께해요!](https://cdn.dailysportshankook.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417921_426057_4256_1762501377_250.jpg)
![[포토뉴스]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제5회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자 간담회](https://cdn.dailysportshankook.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417920_426053_4041_1762501242_250.jpg)
![[포토뉴스]광주광역시 '2025 예술날개 페스티벌 개막'](https://cdn.dailysportshankook.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417871_425964_2326_1762467806_250.jpg)
![[포토뉴스]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청년 일자리 협약 체결](https://cdn.dailysportshankook.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417781_425835_2155_1762352515_250.jpg)

![[포토뉴스]보성군 벌교읍 ‘청정전남 으뜸마을’로 붉은 새잎과 황금 들녘 어우러져](https://cdn.dailysportshankook.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417674_425664_268_1762241170_250.jpg)